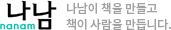| 웨이터가 식탁 옆에 서 있어도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까닭은? | |
|---|---|
| 매체명 : 동아일보 게재일 : 2008-10-02 조회수 : 6090 | |
|
김종갑 건국대 교수 ‘근대적 몸과 탈근대적 증상’ 출간 김종갑(49) 건국대 영문학과 교수의 전공은 문학비평이다. 그런데 김 교수가 2000년 이후 쓴 논문들을 보면 문학비평과 관계없어 보이는 한 가지 주제가 많다. ‘타자로서의 육체―경멸되는 육체와 두려운 육체’ ‘육체의 드러남과 감춤’ ‘공동체 구성원리로서 아름다운 몸과 추한 몸’ ‘공간과 예술, 몸’ ‘고전적 몸과 근대적 몸’ 등이다. 이 논문의 공통 주제는 ‘몸’이다. 그는 “2000년대 들어 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해를 거듭하면서 몸 연구에 더욱 빠져들었고, 지난해 7월에는 국문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 등 다른 분야의 학자들까지 끌어들여 ‘몸 문화 연구소’를 만들었다. 학제 간 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는 최근 ‘근대적 몸과 탈근대적 증상’(나남)을 펴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를 거치면서 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근대 사회에선 육체의 아름다움과 도덕성은 구별되지 않았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곧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근대 들어 이성이 부각되면서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여기고 몸은 부록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버림받았던 몸이 탈근대 사회로 오면서 관심의 한가운데 놓이게 됐고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에게 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묻자 그는 비염 얘기를 꺼냈다. “어릴 때부터 비염을 앓았습니다. 비염이 심해지는 날이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비염이 언제 심해질지는 몸의 주체인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의지나 생각과 무관하게 나를 쥐고 흔드는 몸의 정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것이면서도 또 어쩔 때는 완벽하게 타자(他者)인 ‘몸’에 대해 철학적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외국문학 연구에서 한계를 느낀 것도 몸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배경이 됐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해체비평이니 하는 이론이 한국에 소개되면 반짝 붐을 일으키다가 다른 이론이 들어오면 곧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많다”면서 “유행에 휘둘리는 연구가 아니라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찾던 중 ‘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몸’을 주제 삼아 연구할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팔자걸음을 걷는 조선시대 양반과 종종걸음을 걷던 하인의 몸짓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분석할 수 있다. 피부 색깔에 대한 편견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옆에 서 있어도 손님들은 의식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만약 다른 손님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불편할 겁니다. 이때 웨이터는 ‘비인격적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따져볼 만한 재미있는 소재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전 우리 몸은 컴퓨터 작업을 통해 정보(데이터)로 바뀝니다. 정보화된 몸과 실제 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철학적 사유의 대상입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
|
| 이전글 | 문학의 어머니, 더 높은 산 지으소서 |
| 다음글 | 푸코가 말하는 ‘감시에서 벗어나는 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