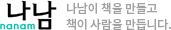| [다시, 빛 속으로] 모국어로 쓸 수 없었던 식민지 청년의 비극적인 삶 | |
|---|---|
| 매체명 : 조선일보 게재일 : 2018-02-23 조회수 : 708 | |
|
지난해 역사소설 '강화도'를 출간해 창작도 병행키로 한 사회학자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두 번째 장편 소설을 냈다. 소설가 김사량(金史良·1914~1950)을 통해 남북한 분단과 6·25전쟁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김사량을 향한 저자의 애정과 오랜 탐구로 빚어진 소설이기에 도입부가 김사량을 향한 헌사로 꾸며졌다. "나는 김사량과 함께 밤을 뒤척였다. 1940년 일본 문학계 최고봉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가, 식민지 조선의 뒤틀린 세계를 일본어로 실어 낸 작가 김사량의 혼백을 불러내 벚꽃 잎이 후드득 떨어지는 교토대학 교정과 시내를 걸었다.(중략) 김사랑은 일본어로 민족의 감각과 현실을 벼려 구원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25세에 쓴 그의 수상작 '빛 속으로'는 식민지 접경에서 구원의 빛을 찾아 출발하는 식민지 청년의 출항 고동이었다."
김사량 연구자들은 그가 일본어로 글을 썼지만, 내면 언어는 어디까지나 조선어였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김사량은 '재일 조선인 문학'의 범주에 갇혀있다. 송 교수는 김사량 문학을 한국 문학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작품에는 박경리의 역사적 울혈, 백석의 토속적 감성, 김승옥의 근대적 감각의 원형이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 소설은 김사량의 말년(1945~1950)을 다큐멘터리와 추리 기법을 병행해 재구성했다. 김사량은 일제 말기에 중국에 갔다가 북한에 자리 잡은 뒤 6·25 때는 인민군 종군기자로 남하했다가 1950년 10월쯤 강원도 원주에서 병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설은 분단 시대의 지식인 김사량이 찾으려고 애쓴 '빛'이 무엇인지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추하려고 한다.
|
|
| 첨부파일 | 다시, 빛 속으로_앞표지.JPG |
| 이전글 | [다시, 빛 속으로] 전업 작가는 결코 알 수 없는, 비작가 시대 |
| 다음글 | [그대에게 연을 띄우며] 한겨레 문학새책 |
|
|